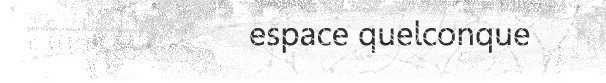알 수 없이 이렇게 답답한 마음,
요새는, 극장에서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를 본다 하면, 물론 그 내용 때문에 먼저 분노하고 불쾌해지지만, 그렇게 치열한 현실을, 시원한 실내에 편하게 앉아 바라보고 있다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부조리한 거 같아서, 그래서 뭔가 꺼림직한 기분이 들곤 한다. 심지어는, 집회에 참가해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곤 한다. 지금 내가 소화기 분말을 마시고, 최루액에 눈물콧물 질질 흘려도, 만약 경찰 방패에 찍혀 갈비뼈가 부러진다해도, 결국 또 이렇게 그럴듯한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럴듯한 인테리어의 카페에 앉아, 조잘대는 커플들에 둘러싸여 혹은 편안한 복장으로 편안히 내 방 안에서 랩탑을 켜고, 완전한 소멸을 준비하기 위해 헛소리를 늘어놓겠지.
바꿀 수 있다. 그런 다큐를, 그런 영화를 만들고, 그런 영화를 보고, 함께 나누고, 글을 쓰고, 책을 읽고, 거리로 나가고, 어떻게든 행동하면 바꿀 수 있다. 조금씩 바뀐다. 그렇게 역사는 바뀌어 왔다. <낙타는 말했다>라는 (한국/독립/장편)영화의 그 포악한 주인공 남자가 생각난다. 그는 나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존재한다. 그는 날것이다. 돈이 없고, 교양이 없다.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나 혹은 왜 그를 그런 상태로 그대로 놓아두었나. 돈과 교양, 그 두 가지만 얘기해 보고 싶다. 특정 사안에 대한 가치 판단 여부 외에 그리고 기본적인 성정을 제외한. 교양의 사전적 정의는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 또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돈과 최소한의 교양을 가질 수 있다면... 자, 이런 이분법을 얘기하고 싶다. 가진 것도 많고, 교양도 철철넘치는 당신, 가난해도 매우 높은 교양 수준을 가지고 있는 당신(문화 권력만 가지고 있는), 교양은 별로 없어 그래도 자본주의의 은총으로 잘 사는 당신 그리고 나. 우리는 모두 같은 사이드. 우리의 공통점은 최첨단 비인간 행위자에 접근 가능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럴듯 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에 의해 조장되고 꾸며진 것이든 뭐든지 간에 하여튼. 그리고 우리의 대척점에 어쩌다 보니 돈도 교양도 풍족하지 않은 소소소시민이 있다. 가난이 죄가 아니고, 앎이 부족한 것이 죄가 아니다. 지구 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가능하면 서로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을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했을 때, 가난하고 교양이 적은 사람들이, 비록 그렇더라도 그들이 그대로 행복하다면 괜찮아. 플러스 알파로 그들의 물질적 정신적 '형편'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면, 그들이 조금 더 행복해 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질 수 있으니, 참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이드에, 그들을 오직 착취가 용이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갈등을 조장하는 개자식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개자식들의 간교함에 맞서 투쟁하는, 아마도 어느 정도의 교양을 소유하고 있을 사람들과 또 나 자신을 그 개자식들과 같은 사이드로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나누었을 때의 이 쪽과 저 쪽의 벽이 가장 높은 것 같아서.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고, 봉사활동 하고, 기부를 하고, 투쟁을 해도 이 모든 게 다 문득 공허로 사라지는 것 같아서. 가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래서, 이 왠지모를 불편함 때문에, 말이 없어지곤 한다. 묵묵히 만들 뿐, 묵묵히 싸울 뿐.
아마도, 이 곳이 고민이 부족한 세상 같아서, 내가 땡깡을 부리고 있는 듯.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