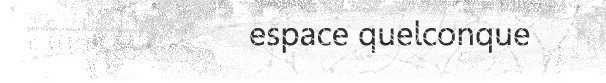"허비 행콕", "코엑스". 검색 버튼 클릭...
2001년 12월 29일과 30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허비 행콕의 공연이 열렸었다. 나도 그곳에 있었다. 그 날이 29일인지 30일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티켓을 모아놓은 서랍을 뒤져보면 그 날이 정확히 몇 일이었는지 알아낼 수 있겠지만... 그 때 코엑스 오디토리움은 굉장히 웅장한 공간이었고 나의 머리카락은 내 어깨를 덮고 있었다. 지난 10월 24일, 허비 행콕이 건반을 연주하던 그 무대에 서서 나는 "그만!"이라고 크게 외쳤고 "객석"에 앉아 테스트를 치르던 입사지원자님들께선 필기구를 놓으시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셨다.
더 이상 그 곳은 웅장한 공간이 아니다.
넌
요새는 다른 무언가를 할 여유가 없다. 모처럼 쉬었던 어느 일요일 <디스트릭트 9>과 <알제리 전투>를 봤었고, 지난 일요일에는 칸 광고제 수상작 영상과 <파주>를 봤다. 파주. 파쥬-파주파 주파주파주파 우렁찬 엔진 소리... 아! 쿠엔틴 타란티노의 <바스터즈>, 우니 르콩트의 <여행자>를 제끼고 박찬옥의 <파주>를 먼저 챙겨본 것은... 음.
<파주>는, 기척없이 스크린을 잠식하던 그 안개처럼 의뭉스러운 영화였다. 실망했다. 아니, 그냥 많이 아쉬웠고 나는 감독님에게 마구 어리광을 피우고 싶었다. <파주>는 해석의 여지가 많은 영화다. 모든 걸 자세히 설명해 주는 친절한 영화가 아니다. 불친절한 영화에 그 누구보다 익숙하지만, 내게 이번에 그 불친절함은 살갑게 다가오지 못했다. 피곤해서였을까? 내가 변해서? 정신없이 점멸하는 광고 모듬 세트를 막 보고 와서?
스스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영화 좋아하지만 그 날만은, 굳이 정신적인 노력을 들이지 않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서 먹먹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이야기 자체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느낌. 내가 편하게 슬프고 편하게 눈물 흘릴 수 있는 영화. 구태의연한 신파물 말고... 왜 그런 영화 있잖나. 에릭 로메르...?; 비선형이 아니라 선형 구조 속에서 절절한 안식을 느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엉뚱하게도. <파주>를 보며 계속 떠나지 않았던 생각은 "단.결 투.쟁 뿐이다". 이 시대 노말한 직장인의 절대 목표인 "내집 마련". 그 구호 속 어딘가에, 영원히 오르는 집값과 이득을 취하는 업자와 이리저리 내몰리는 철거민이 있고, 나의 작은 고민이 있다. 노말한 경제력과 앱노말한 정신상태를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이 부조리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리고 외롭다. 회사에서 하는 일은 매일 새로워 재미있으며 자꾸 외롭다. 이 이질적인 감정들의 불협화음을 내심 즐기고 있으면서도...
흠. 고지연의 공연과 김두수의 공연과 쌈싸페, 진현숙의 아르스노바 공연을 보고 싶었다. 김광민! 유재하 추모를 테마로 할 김광민의 공연을 보러 가고 싶으나, 그 날은 임원면접을 진행해야 한다... 앞으로 기회는 많겠지. "지금은 우리가 멀리 있을 지라도" & 김광민이 유재하를 그리며 만든 "지구에서 온 편지"를 듣는다. 텅 빈 버스. 한강의 야경.
2001년 12월 29일과 30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허비 행콕의 공연이 열렸었다. 나도 그곳에 있었다. 그 날이 29일인지 30일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티켓을 모아놓은 서랍을 뒤져보면 그 날이 정확히 몇 일이었는지 알아낼 수 있겠지만... 그 때 코엑스 오디토리움은 굉장히 웅장한 공간이었고 나의 머리카락은 내 어깨를 덮고 있었다. 지난 10월 24일, 허비 행콕이 건반을 연주하던 그 무대에 서서 나는 "그만!"이라고 크게 외쳤고 "객석"에 앉아 테스트를 치르던 입사지원자님들께선 필기구를 놓으시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셨다.
더 이상 그 곳은 웅장한 공간이 아니다.
넌
요새는 다른 무언가를 할 여유가 없다. 모처럼 쉬었던 어느 일요일 <디스트릭트 9>과 <알제리 전투>를 봤었고, 지난 일요일에는 칸 광고제 수상작 영상과 <파주>를 봤다. 파주. 파쥬-파주파 주파주파주파 우렁찬 엔진 소리... 아! 쿠엔틴 타란티노의 <바스터즈>, 우니 르콩트의 <여행자>를 제끼고 박찬옥의 <파주>를 먼저 챙겨본 것은... 음.
<파주>는, 기척없이 스크린을 잠식하던 그 안개처럼 의뭉스러운 영화였다. 실망했다. 아니, 그냥 많이 아쉬웠고 나는 감독님에게 마구 어리광을 피우고 싶었다. <파주>는 해석의 여지가 많은 영화다. 모든 걸 자세히 설명해 주는 친절한 영화가 아니다. 불친절한 영화에 그 누구보다 익숙하지만, 내게 이번에 그 불친절함은 살갑게 다가오지 못했다. 피곤해서였을까? 내가 변해서? 정신없이 점멸하는 광고 모듬 세트를 막 보고 와서?
스스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영화 좋아하지만 그 날만은, 굳이 정신적인 노력을 들이지 않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서 먹먹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이야기 자체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느낌. 내가 편하게 슬프고 편하게 눈물 흘릴 수 있는 영화. 구태의연한 신파물 말고... 왜 그런 영화 있잖나. 에릭 로메르...?; 비선형이 아니라 선형 구조 속에서 절절한 안식을 느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엉뚱하게도. <파주>를 보며 계속 떠나지 않았던 생각은 "단.결 투.쟁 뿐이다". 이 시대 노말한 직장인의 절대 목표인 "내집 마련". 그 구호 속 어딘가에, 영원히 오르는 집값과 이득을 취하는 업자와 이리저리 내몰리는 철거민이 있고, 나의 작은 고민이 있다. 노말한 경제력과 앱노말한 정신상태를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이 부조리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리고 외롭다. 회사에서 하는 일은 매일 새로워 재미있으며 자꾸 외롭다. 이 이질적인 감정들의 불협화음을 내심 즐기고 있으면서도...
흠. 고지연의 공연과 김두수의 공연과 쌈싸페, 진현숙의 아르스노바 공연을 보고 싶었다. 김광민! 유재하 추모를 테마로 할 김광민의 공연을 보러 가고 싶으나, 그 날은 임원면접을 진행해야 한다... 앞으로 기회는 많겠지. "지금은 우리가 멀리 있을 지라도" & 김광민이 유재하를 그리며 만든 "지구에서 온 편지"를 듣는다. 텅 빈 버스. 한강의 야경.